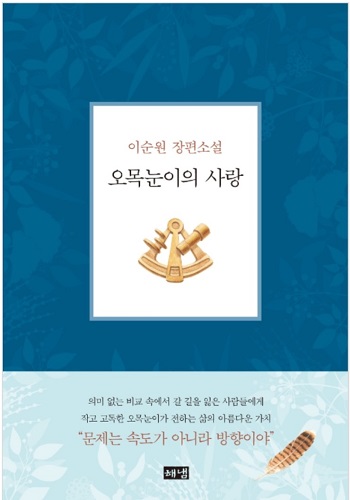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쫓기다가 너무 지쳐서 축 늘어져 있을 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룬 것은 미미하고 엉뚱한 곳을 헤맨 것 같아 허망하기만 할 때.
하지만 아무리 생각에 이마를 부딪쳐 보아도 막막하기만 했을 것이다. 삶의 패턴을 바꿀 뾰족한 수도 없고 익숙한 궤도를 이탈할 용기도 없으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생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되풀이된다. 질문의 중심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주변만을 떠돌다가 다시 원점에 다다르고, 다시 도망으로 이어지고.
이순원 작가의 소설 『오목눈이의 사랑』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멈추고 생각의 가지를 새로 뻗게 해주는 책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는 흔히 뱁새라고 부르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육분이’. 육분이의 둥지에 자신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뻐꾸기가 알을 낳고, 육분이는 두 번씩이나 그 알을 품어서 뻐꾸기 새끼를 키워낸다.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육분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준다.
‘처음 한 번 속을 때는 속은 우리보다 우리를 속이는 뻐꾸기가 나쁘다. 똑같은 푸른색이어도 우리 알보다 뻐꾸기 알이 훨씬 크다. 알의 크기가 다른데도 우리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속는다. (……) 그러나 똑같은 일로 두 번 속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속이는 쪽보다 속는 쪽이 더 나쁘다.’
오목눈이는 뻐꾸기의 알을 보면서 자기가 그 알을 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는다. 그런 욕심이 그 큰 알을 품게 하고, 알을 깨고 나온 뻐꾸기 새끼를 힘겹게 키우는 것이다. 우리 역시 오목눈이처럼 눈 먼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이나 뻐꾸기 새끼를 길러내면서 아픈 경험을 했지만 육분이는 세 번째에도 뻐꾸기 알을 품고 ‘앵두’를 키워낸다. 같은 일이 세 번이나 연속되자 육분이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예정되어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 애틋하게 보살핀다. 그러나 앵두는 나는 연습을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날아온 제 어미를 따라 둥지를 떠나버린다.
앵두가 가버린 후 육분이는 앵두를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앵두를 찾아 떠난다. 뻐꾸기가 날아간 아프리카까지.
육분이가 앵두를 찾아가는 동안 떼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들도 보게 되고, 경전을 읽는 독수리도 만나고, 이상한 새를 통해 잘못 전해진 비유도 듣게 되고, 먼 바다를 건너는 잠자리 떼도 보게 된다.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철학적인 성찰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뻐꾸기가 그 먼 거리를 날아오는 이유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새끼를 낳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육분이는 100일하고도 7일이 걸려서 드디어 앵두를 만난다. 만나자마자 해준 첫 번째 말.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 그것만 지키면 안전하니까.”
이 말은 육분이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철학하는 오목눈이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을 통해 알게 된 지혜도 포함해서.
이 책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들을 더 품게 한다. 그 질문들은 그러나 무턱대고 속도를 내는 불안한 질주에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이다. 제대로 된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멈춰 서는 것부터 해야 하니까.
권태현(출판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