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로드] 디지털치료제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대 과제로 꼽혔다. 전통적인 치료방법의 대체재로 입증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기는 더욱 까다롭다는 것이다.
디지털치료제란 일반 약물을 대체하거나 보조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앱·게임·웹솔루션·가상현실 등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의학적 효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성게임이나 앱보다 한 발 나아간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디지털테라피 혹은 디지털테라퓨틱스(Digital therapeutics, DTx)로 부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디지털치료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와 학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치료제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사 눅스바이오 박주호 대표는 “디지털치료제 자체의 걸림돌보다는 산업 초기에 겪는 문제가 많다”며 4가지 애로사항을 꼽았다.
첫째는 개념과 분류에 대한 모호함이다. 용어가 기존 치료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조 소프트웨어와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산업 불확실성이다. 전통적 제약산업의 경우 100년 이상 영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디지털치료제산업에서는 보험제도와 허가제도 승인 여부 및 시장 형성이 불확실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IP(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미흡, 제약사나 신약개발에 비해 부족한 투자 등을 꼽았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험사 관점에서는 디지털치료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로서는 비용 절감과 효과가 입증된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해야 상용화되기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치료제를 공적 건강보험 환급 대상으로 채택한 유럽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미국 디지털치료제 개발사 프리스피라 역시 보험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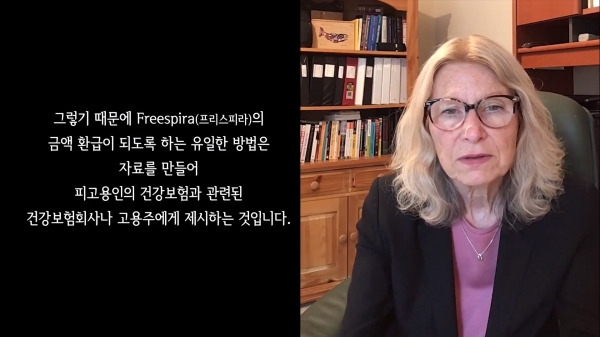
데브라 라이젠탈 CEO는 “FDA 승인 과정에 걸린 시간은 6개월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며 “보험 환급 대상이 되는 과정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라이젠탈 CEO는 미국에서 디지털치료제가 환급 대상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비용과 효과 입증 자료를 보험사에 지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사는 디지털치료제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보고 싶어 한다”며 “프리스피라도 보험 혜택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과정에서 최장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피파이헬스 크리스 와스덴 대표는 디지털치료제 상용화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와스덴 대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디지털치료제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디지털치료제는 이미 검증된 기성 치료법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치료를 경험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스덴 대표는 디지털치료제 의학적 승인의 최대 난제로 ‘의료계 관행’을 꼽았다. 그는 “인정받는 과정에서 환자나 규제기관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수월한 편”이라며 “최대 난제는 의료계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 디지털치료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비용·인력·시간을 모두 절약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설득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의사들을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그들을 실제로 고용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의료와 보험 환경이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사 중심으로 보험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한국과 해외 사례를 비교할 때는 이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